토요타 미래도시 우븐시티 1단계 완공...올 가을 입주 시작
2025-02-24

1898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녁. 루이 르노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직접 만든 차에 오른다. 이를 본 친구들은 언덕에 오를 수는 있냐며 놀려댄다. “이게 무슨 차야? 언덕도 못 오르겠다” 자존심 상한 루이 르노는 친구들을 한 명씩 태워 보란듯이 파리에서 가장 높은 언덕인 몽마르뜨를 오르 내린다.
그 날 저녁 식사가 끝나고 12명의 친구는 그 자리에서 현금을 주며 자동차를 주문한다. 이후 루이 르노는 아버지 집의 정원 안 쪽 아틀리에에서 차를 만들기 시작한다. 많은 양의 자동차를 만들기 힘들어지자 르노는 자신의 형인 마르셀 르노, 페르낭 르노와 함께 기술, 행정, 관리 등을 각각 맡아 회사를 차리기로 한다. 이 회사가 바로 지금의 르노그룹이다.
공학과 역학에 관심 많던 한 20대 청년의 손에서 시작한 르노 그룹이 올해로 120년을 맞았다. 파리모터쇼 프레스데이가 끝난 다음 날, 르노 그룹이 120년 동안 만든 자동차가 모여 있는 곳 파리 인근 플랑 공장의 ‘르노 개러지’를 방문했다. 파리에서 40분 가량 떨어진 곳에 1952년부터 자리해 있던 르노 제 2공장 안에 있다.
공장 입구에 들어서자 오래돼 보이는 흰색 건물들이 즐비해 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난다. 이 곳에서는 르노의 클리오, 전기차 조에와 닛산 미크라 등 주로 소형차를 생산한다. 또 르노 자동차의 키(열쇠) 전량을 이 곳에서 생산한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키도 이 곳에서 생산한다고.
르노 개러지로 들어가는 길은 마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듯하다. 계단을 내려가는 길에 흰색 콘크리트 벽과 은근하게 올라오는 퀴퀴한 냄새는 이 건물이 지나온 시간을 말해준다. 르노 개러지는 말 그대로 ‘개러지(garage, 차고)’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전시 목적으로 만든 곳이 아닌 보관 장소다.

개러지에 들어서니 마치 비밀 창고에 들어온 듯하다. 평소엔 보기 힘든 클래식카부터 콘셉트카, F1 머신까지 다양한 차가 늘어서 있다. 입구는 역시나 르노 최초의 자동차 ‘타입 A’가 맞이한다. 1898년부터 시간 순으로 크고 작은 차들이 줄지어 있고, 한 쪽에는 120년을 맞이한 올해가 2018년이기 때문에 끝자리가 8로 끝나는 해에 만든 차가 여러 대 세워져 있다.
이날 설명은 루도빅 피히우(Ludovic Piriou) 르노 클래식 커뮤니케이션 매니저가 맡았다. 푸근한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듯 편안하게 각 자동차별 역사와 특징을 풀어나갔다. 초창기 소량 주문 제작한 자동차부터 르노 최초의 자체 생산 엔진, 르노의 대량 생산이 시작된 모델 르노4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나갔다.
‘타입 A’ 이후 생김새는 여전히 마차와 비슷하지만 훨씬 크고 번쩍 번쩍한 자동차가 등장했다. 앞에는 운전석과 보조석이 있고 뒷좌석에는 주인이나 친구 손님 등을 태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다. 이 뿐만 아니라 여행을 갈 때 짐을 차 위에 실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당시에 이미 이용자들의 편의를 추구하는 흐름이 시작된 것.
이 때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매우 비쌌다. 비싸서 구매하는 사람도 매우 적었다. 르노 그룹은 차를 좀 더 많이 팔기 위해 다양한 용도로 차를 만들어야했다. 르노는 택시를 택했다. 이 때 등장한 것이 프랑스의 첫 택시로 잘 알려진 ‘타입 AG1’이다. 앞 유리창 왼쪽에는 미터기를 달고 있다.

타입 AG1은 전쟁터에 나간 자동차로도 유명하다. 1914년 프러시아군이 프랑스를 쳐들어 올 당시 방어선을 구축했어야 했다. 이 때 대부분 군인들은 말이나 기차를 타고 혹은 걸어서 전쟁터로 나갔다. 한 시가 급박한 때 느리고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 장군은 모든 프랑스의 택시를 징발했다. 1000대 가량되는 택시가 총기와 짐을 싣고 전쟁터로 향했다. 전쟁에서 최초로 사용된 자동차로 이름을 남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동차 모양은 변해갔다. 겉으로 드러나 있던 헤드라이트나 휠하우스, 발 받침대는 차체로 덮히거나 사라졌다. 보닛 앞에 붙어 있던 경적 소리를 뿜어 내는 구멍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옵션이었던 사이드미러는 차량 양 쪽에 당연하게 붙어 나왔다.

한 가지 크게 달라진 점은 운전대의 위치다. 개러지에 전시된 초창기 자동차를 보다 보면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도로를 살펴 다니기 위해서다. 당시엔 도로 사정도 별로 안 좋았을 뿐더러 도로에 차가 별로 없었다. 그러려면 운전대가 오른쪽에 달려있는 것이 훨씬 수월했다. 지나는 도로에 구멍이 나 있진 않은지 커다란 장애물은 없는지 살펴야 했던 것이다.
도로 사정 좋아지고 자동차 양이 많아지자 앞서 가는 차를 추월하거나 다른 차와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러면서 운전대는 왼쪽으로 옮겨 갔다. 지금도 프랑스의 일부 배달차에는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다. 내려서 바로 물건을 전해주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1950년대까지 프랑스의 한 자동차 회사는 운전대를 오른쪽에 만들었다. 왼쪽으로 옮길 수도 있었지만 옵션이었다.

르노는 ‘르노4’라는 차를 통해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 당시 르노 회장은 “청바지 같은 차를 만들자”고 했고 미국의 청바지처럼 미적으로 예쁘진 않더라도 기능을 믿고 쓸 만한 차를 만들어 보자고 직원들을 설득했다. 그렇게 르노는 대중차로서 이름을 널리 알렸다.
개러지를 둘러보는 2시간 동안 120년이라는 시간을 모두 훑을 순 없었지만 자동차에 대한 르노의 집념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곳이었다. 또 현재 모델들의 발판이 되는 브랜드의 역사와 헤리티지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다.
파리=이다정 기자 dajeong@autocast.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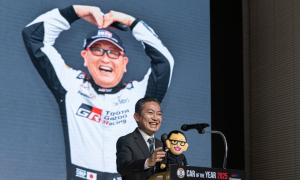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