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미래도시 우븐시티 1단계 완공...올 가을 입주 시작
2025-02-24

공원 가는 길엔 버스와 RER을 이용하기로 한다. 먼저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걸었다. 마음만 먹으면 RER 역까지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 춥고 바람 부는 날씨에 0.1초 만에 걸어갈 마음을 거둔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역으로 향하는 126번 버스가 왔다. 전 날 지하철에서 미리 구입한 1회권 티켓을 사용했다. 버스에 이번 정류장과 다음 정류장을 알려주는 안내 방송은 없다. 정류장명이 흐르는 기다란 전광판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파리의 대중교통은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 편리하지만, 이용객들에게 친절한 편은 아니다. 버스 뿐만 아니라 지하철에도 안내 방송이 없는 곳이 대다수다. 버스에 탄 지 5분이 채 안 돼 내려야 할 역의 이름이 전광판에 흐른다. 버스를 둘러볼 겨를도 없이 서둘러 내린다. 짧게 둘러 봤지만 이날 탄 버스는 파리에서 탄 대중 교통 중 가장 깔끔하다.
버스에서 내리니 바로 건너편에 RER 타는 곳이 보인다. RER은 파리 중심지에서 살짝 벗어난 곳을 연결하는 교외 전철이다. 그래서 파리 시내 지하철 티켓으로는 탈 수 없다. 혹시 환승이 가능한가 싶어서 방금 내린 버스에서 사용한 티켓을 개찰구에서 그대로 넣었다. 빨간색 ‘X’표시와 함께 다시 내뱉는다. 안내 창구로 향했다.
“파리로 가요?” 역무원이 묻는다. ‘여기가 파리인데 왜 파리로 가냐고 묻는거지?’ 아차 싶어 다시 생각해보니 여긴 파리 시내를 살짝 벗어난 교외다. RER을 탈 수 있는 표를 다시 산다. 개찰구를 통과해 RER을 타러 간다. 여러 갈래로 나뉜 길에 혼란스럽지만 RER에 올라탄다.

갑자기 싸한 기분이 든다. 구글맵을 켜고 현재 위치를 확인한다.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 목적지의 반대 방향이다. 더 멀어지기 전에 서둘러 내린다. 내려보니 어쩐지 익숙하다. 2년 전 출장으로 왔던 파리모터쇼가 열리는 베르사이유 박람회장이다. ‘곧 있을 모터쇼장에 이렇게 오면 되겠구나’ 답사한 셈 친다.
내린 곳에서 시트로엥 공원까지는 걸어서 20분. 버스 대신 걷기로 한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내렸는데도 걸어서 20분이면 갈 수 있다니. 파리가 큰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다. 긴장이 풀어지고 목적지에 거의 다 와가니 춥고 배고파진다. 파리는 대부분의 식당이 오후 2시 반부터 브레이크 타임이다. 브레이크 타임에 딱 걸린 시간이라 문 열린 곳 아무 데나 들어간다. 파니니와 샌드위치를 파는 곳이다.
공원 출발 전 구글맵이 알려준 소요 시간은 30분. 이와 상관없이 1시간 30분 만에 시트로엥 공원에 도착했다. 바람 불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날씨지만 공원은 평화롭다. 1915년에 지어진 시트로엥 자동차 공장을 1970년대 외곽으로 옮긴 후 그 자리에 도시 재정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이다. 1980년대 파리에서 진행한 최대 토목 사업이었다고 한다.

공원의 중심부로 향했다. 단순히 시트로엥의 공장이 있던 곳이라서 창립자의 이름을 붙인걸까?, 왜 시트로엥 공원이지? 의문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공원을 둘러보니 조금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공원을 둘러보니 창의력이 샘솟는 기분이다. 한 군데도 소홀한 공간이 없다. 공원은 너른 직사각형 잔디 광장을 중심으로 분수와 두 개의 유리 온실, 서로 다른 식물을 심어 놓은 정원들로 둘러 싸여있다. 정원은 구획마다 개성이 넘친다. 네모나게 똑똑 잘라 놓은 나무와 대각선으로 비딱하게 심어져 있는 나무, 동그란 공 모양으로 다듬은 풀까지. 시트로엥의 창립자 앙드레 시트로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비로소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앙드레 시트로엥은 모험가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스티어링 휠이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능 등 초기 유럽 자동차에 혁신적인 기술을 대거 도입했다. 또 독특하고 톡톡 튀는 광고 마케팅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르노나 푸조보다 비교적 늦게 산업에 발을 들인 시트로엥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1925년부터 1934년까지 에펠탑에 시트로엥 글자를 수십만 개 조명으로 수놓았다. 누구라도 멀리서 시트로엥이라는 글자를 볼 수 있도록. 이 밖에도 자동차의 내구성을 보여주겠다며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고, 코끼리를 차 위에 얹어 파리 시내를 주행하기도 했다.
파리=이다정 기자 dajeong@autocast.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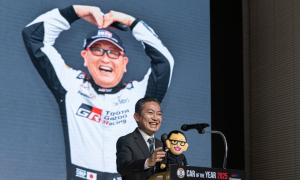












댓글
(0) 로그아웃